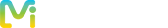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가상자산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와 이용자의 증대로 가상자산 거래를 둔 법적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보관과 거래에 활용되는 전자지갑은 이해하기 어려운 긴 문자·숫자의 조합열로 되어있어 착오송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원은 법정화폐의 착오송금에 대해 송금된 금원을 ‘재물’로 보아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도의 거래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취인에게 착오송금된 금원을 보관해야 할 신임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정화폐와 달리 횡령·배임죄 성립 여부에 차이를 보입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①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②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특성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으며, ③가상자산 착오송금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을 배임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의 반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민사상 책임과 별개이며, 당사자간 신임관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법정화폐와 차이를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상자산 착오송금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가상자산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