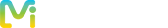하나의 데이터가 모이면 데이터집합 또는 빅데이터가 됩니다.
홀로 있을 때엔 1의 가치만을 가졌던 데이터는 모일수록 그 가치가 커지거나, 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며, 이 새로운 가치는 공익적 가치를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슈로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81826 판결).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보면, 김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유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후 공개처분이 되자 사단법인 대한화장품협회가 정보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가 비록 각각 한 개의 제품에 대한 데이터지만, 대다수 품목의 성분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 데이터는 여러 방면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는 ‘빅데이터’로 볼 수 있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에 기고한 판례해설(단일 데이터와 데이터 집합(빅데이터)의 법적 평가)을 통해 이 사건 법원의 판결에서 ▲빅데이터의 양면성,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 취지와의 연관성, ▲빅데이터 시대의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 등 3가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