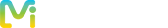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가상자산 현금화를 통한 강제집행의 길이 열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음란물유포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판결).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법리는 계속해서 축적되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뚜렷한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압류된 이더리움 가상자산을 추심에 갈음해 매각하고 현금화하라는 취지의 특별현금화 명령을 내렸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물꼬가 열렸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사건으로 피해를 본 다수의 이용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해킹된 가상자산이 발견돼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채권 기반의 압류를 걸었고, 몇 차례 중간재판을 거쳐 최종적인 결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별현금화명령을 내리며, 매각방법에 대하여 매각일의 시장가격 등 적정한 가격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 재산은 채무자가 관리하는 가상자산이 아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으로, 가상자산은 비밀로 관리되는 개인키의 정보를 집행관이 알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결정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의 과정과 결정 사항을 상세히 소개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보여준 법원 결정의 법적 의미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