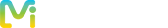김정원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일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의 근로계약이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해 이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부여되는 15일이 아닌 11일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근로계약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이후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에 대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하므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우리 법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와 법적 기준은 물론,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개념과 활용 전략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