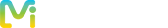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가상화폐 착오송금과 배임·횡령’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은행 계좌에 돈이 잘못 송금되었을 때, 수취인이 해당 금액이 잘못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가상화폐의 경우 역시 일반적인 은행 계좌 간 거래와 같이 상대의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를 송금한다는 점에서 위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우리 법원은 가상화폐 착오송금에 대한 횡령죄, 배임죄는 그 성립 기준에 일반적인 화폐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우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신임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자에게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횡령죄의 요건인 ‘재물’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가상화폐의 임의소비나 반환 거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노171판결).
또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횡령죄와 달리 그 당사자를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착오 송금된 가상화폐의 임의 사용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신임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법원은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 달리 송금인과 수취인의 상세한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워 당사자 간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인불명의 가상화폐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9789판결).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가상화폐 착오송금 관련 횡령·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원 판례를 상세히 소개하며,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